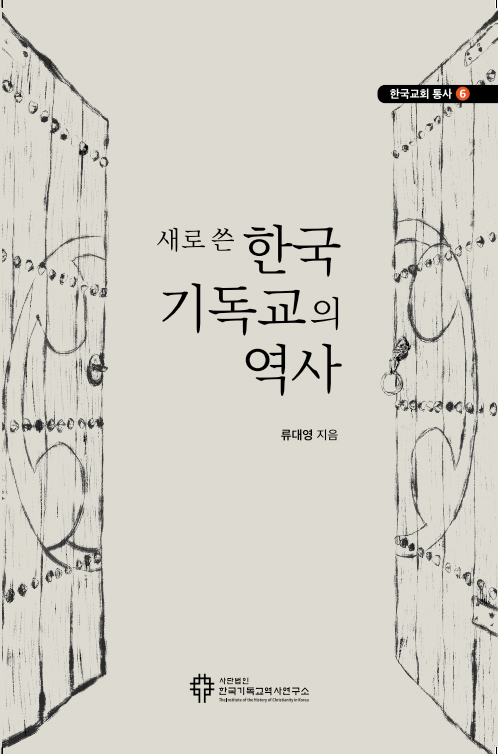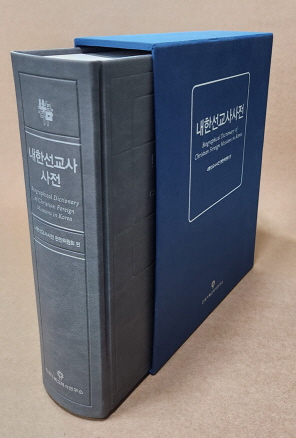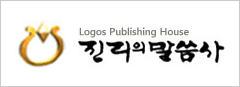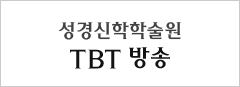ьЋЎВѕа
Ж│╝Ж▒░вАю ьўёВъгвЦ╝ ВќхВЋЋьЋўвіћ ВЌГВѓгВБ╝ВЮўвЦ╝ Ж▓йЖ│ёьЋўвЮ╝!
вІѕВ▓┤віћ в░ћВацвїђьЋЎ Ж│аВаё вгИьЌїьЋЎ ЖхљВѕўвАюВёю сђјв░ўВІювїђВаЂ Ж│аВ░░(Unzeitgemässe Betrachtungen)ВЮё в░юЖ░ёьЋювІц. вІ╣ВІю вЈЁВЮ╝ВЮђ ВЌГВѓгВБ╝ВЮў(Historismus)ВЮў ВаёВё▒ЖИ░ВўђВіхвІѕвІц. ВЌГВѓгВБ╝ВЮўвіћ ВЌГВѓгвЦ╝ ВаѕвїђьЎћьЋеВю╝вАюВЇе вфевЊа ВЮИЖ░ё ьўёВЃЂЖ│╝ вгИьЎћвЦ╝ ВЌГВѓгВаЂ вДЦвЮй ВєЇВЌљВёювДї ВЮ┤ьЋ┤ьЋўвацвіћ Ж▓йВДЂвљю ьЃювЈёвЦ╝ ВДђвІївІц. ЖиИвдгЖ│а Ж│╝Ж▒░ ВДђьќЦВё▒ВЌљ Ж│аВ░ЕвљеВю╝вАюВЇе ьўёВъгВЎђ в»ИвъўвЦ╝ Ж│╝Ж▒░ ВѓгВІцВЮў вѕёВаЂ┬иВЌ░ВєЇВё▒Вю╝вАю ВёцвфЁьЋўЖ│аВъљ ьЋювІц. ЖиИваЄЖИ░ вЋївгИВЌљ Ж░ЮЖ┤ђВё▒ВЮё вДѕВ╣ў ВІаьЎћВ▓ўвЪ╝ ВІав┤ЅьЋювІц. ВЮ┤віћ ВЌГВѓгВаЂ ВѓгВІцВЌљ вїђьЋ┤ Ж░ђВ╣ўВцЉвдйВаЂ ьїљвІеВЮ┤ Ж░ђвіЦьЋўвІцЖ│а в│┤вЕ░ ВєїВюё РђўВъѕвіћ ЖиИвїђвАю(wie es eigentlich gewesen)РђЎ ЖИ░ВѕаьЋа Вѕў ВъѕвІцвіћ Ж│╝вЈёьЋю ьЎЋВІаВЌљ ВѓгвАюВъАьъївІц. ЖиИвЪгвЕ┤Вёю ВДёвдг┬иЖ░ђВ╣ў┬иВаювЈёвъђ ВаѕвїђВаЂ ЖИ░ВцђВЮ┤ ВЋёвІѕвЮ╝ ВІювїђВЎђ вДЦвЮйВЌљ вћ░вЮ╝ Ж▓░ВаЋвљювІцвіћ ВЃЂвїђВБ╝ВЮўвЦ╝ Ж░ЋВА░ьЋўвЕ░, в░ЕвїђьЋю ВъљвБї ВѕўВДЉ┬ив╣ёЖхљ┬иВЌ░ЖхгВЌљ ВДЉВцЉьЋўвЕ┤Вёю ьЋЎвгИВаЂ ВаёвгИьЎћвЦ╝ ЖЙђьЋювІц. ВЮ┤ваЄЖ▓ї Ж│╝Ж▒░ВЌљ вїђьЋю Ж░ЮЖ┤ђВаЂ┬иЖ│╝ьЋЎВаЂ ВЌ░ЖхгвЦ╝ ьєхьЋ┤ ьўёВъгВЎђ в»ИвъўвЦ╝ ЖиюВаЋьЋўвацвіћ ВЃЂвїђВБ╝ВЮўВаЂВЮИ ВЌГВѓгВБ╝ВЮўвіћ ВДђВІЮВЮђ вХёвфЁ віўВќ┤вѓўВДђвДї ЖиИвЪгьЋаВѕўвАЮ ВѓХЖ│╝ вІеВаѕВЮё ВЋ╝ЖИ░ьЋа Вѕўв░ќВЌљ ВЌєвІцвіћ Ж▓ЃВЮ┤ вІѕВ▓┤ВЮў ВДђВаЂВЮ┤вІц. въЉВ╝ђ(Ranke) ВѓгьЋЎ, ьЌцЖ▓ћВІЮ ВЌГВѓгВ▓аьЋЎ, Ж┤┤ьїЁЖ▓љ ьЋЎьїї вЊ▒ВЮђ ВЌГВѓгВаЂ ВѓгВІцВЮў ВХЋВаЂЖ│╝ Ж│╝Ж▒░ВЌљ вїђьЋю ВѕГв░░Ж░ђ ВѓХЖ│╝ ЖиИ вгИьЎћвЦ╝ ВДђв░░ьЋеВю╝вАюВЇе Ж│╝Ж▒░Ж░ђ ьўёВъгВЎђ в»ИвъўвЦ╝ вДѕв╣ёВІюьѓцвіћ Ж▓░Ж│╝вЦ╝ В┤ѕвъўьЋювІцвіћ Ж▓ЃВЮ┤вІц.
ВЌГВѓгвіћ в│Ивъў ВѓХВЮё ВюёьЋю в┤ЅВѓгВъљЖ░ђ вљўВќ┤ВЋ╝ ьЋўвіћвЇ░, вІ╣ВІю ьЋЎвгИВЮђ Вўцьъѕвац ВѓХВЮё ВќхВЋЋьЋўвіћ ьЈГЖх░Вю╝вАю в│ђВДѕьќѕвІцЖ│а в│┤віћ вІѕВ▓┤віћ ВЌГВѓгвЦ╝ ьўёВъг ВѓХВЮў ВцЉВІгВЌљВёю в╣ёьїљВаЂВю╝вАю ВЃѕвАГЖ▓ї ЖиюВаЋьЋўЖ│аВъљ ьќѕвІц. РђўВѓХВЮё ВюёьЋю ВЌГВѓгВЮ┤Вќ┤ВЋ╝ВДђ ВЌГВѓгвЦ╝ ВюёьЋ┤ ВѓХВЮё ьЮгВЃЮВІюВ╝юВёювіћ ВЋѕ вљювІцРђЎвіћ Ж▓ЃВЮ┤ вІѕВ▓┤ВЮў В▓аВ╣Ў(жљхтЅЄ, ehernes Gesetz)ВЮ┤ВЌѕвІц. ьі╣ьъѕ вІѕВ▓┤віћ ВЮИЖ░ёВЮё ьќЅвЈЎ вХѕвіЦ, В░йВА░Вё▒ ВЃЂВІц, ВѓХВЮў вг┤ваЦЖ░љВЌљ в╣авюевдгвіћ ВДђвѓўВ╣ю ВЌГВѓг ВДђВІЮВЮё В▓аВађьъѕ Ж▓йЖ│ёьЋювІц. Рђўв░ЋВІЮьЋюРђЎ ьўёвїђВЮИВЮђ вДјВЮђ Ж▓ЃВ▓ўвЪ╝ в│┤ВЮ┤ВДђвДї ВіцВіцвАю ВъљЖИ░ ВѓХВЌљ ВюаВџЕьЋю Ж░ђВ╣ўвЦ╝ В░йВА░ьЋўЖ▒░вѓў в»ИвъўвЦ╝ ВЌ┤Вќ┤Ж░ѕ ьъўВЮђ ВЃЂВІцьЋю ВІювїђЖ░ђ вІѕВ▓┤вЦ╝ ВЌГВѓгВЌљ ВДЉВцЉьЋўЖ▓ї ьќѕвІц. вІѕВ▓┤ВЌљЖ▓ї ВЌГВѓгвіћ вІеВѕюьЋю ьЋЎвгИВЮ┤ ВЋёвІѕвЮ╝ вгИьЎћ┬иЖхљВюА┬иВѓХВЮў ВДѕВёю ВаёВ▓┤вЦ╝ ВбїВџ░ьЋўвіћ ВЃЮВЃЮьЋю ВѓХ ВъљВ▓┤ВЮў вгИВаюВЎђ ВДЂЖ▓░вљювІц. ЖиИвъўВёю ве╝Вађ ВЌГВѓгВаЂ ВѓгЖ▒┤ВЮў ВЮИЖ│╝Ж┤ђЖ│ёвЦ╝ вІеВаѕьЋўвіћ Ж│ёв│┤ьЋЎВаЂ ьЃљЖхг в░ЕВІЮВю╝вАю ВЌГВѓгЖ░ђ ВѓХВЮё ВќхВЋЋьЋўвіћ вѓ┤ваЦВЮё ьЈГвАюьЋўЖ│а вІ╣вїђ вгИьЎћвЦ╝ в╣ёьїљьќѕвІц. ВѓХВЌљ в┤ЅВѓгВъљЖ░ђ вља Вѕў ВЌєвіћ ВЌГВѓгвЦ╝ В▓аВађьъѕ в░░Ж▓ЕьЋўвіћ вІѕВ▓┤ВЌљЖ▓ї ВЌГВѓгВЎђ ВЃЮВА┤ВЮђ Ж▓░Вйћ вХёвдгьЋа Вѕў ВЌєвіћ вЈЎВЮ╝ьЋю в▓ћВБ╝вІц. ЖиИвъўВёю вІѕВ▓┤Ж░ђ В▓аВађьъѕ Ж▓йЖ│ёьЋўвіћ ВЮИЖ░ё ВюаьўЋВЮђ Ж│╝Ж▒░ВЮў Ж▓ЃВЮё ВдљЖИ░вЕ┤Вёю вЈЎВІюВЌљ ЖиИ Ж│╝Ж▒░Ж░ђ ьїївЕИвІ╣ьЋа Ж▓ЃВЮё Вџ░вацьЋўвЕ░ вфИВёювдгВ╣ўвіћ ВъљвЊцВЮ┤вІц. ВЎювЃљьЋўвЕ┤ ВЮ┤вЪгьЋю ВёИЖИ░вДљВЮў ВюаьўЋвЊцВЮђ в»Ивъў В░йВА░ВЮў вЈЎваЦВЮђ ВаљВаљ ВЃЂВІцьЋўвЕ┤Вёю ьЋГВЃЂ РђюВЋъВю╝вАю Вўг Вќ┤вќц ВѓХвЈё ЖиИвЊцВЮў ВѓХВЮё ВаЋвІ╣ьЎћьЋа Вѕў ВЌєРђЮ(358)вІцЖ│а в│┤віћ ВъљвЊцВЮ┤вІц. вІѕВ▓┤віћ вІ╣вїђ ВЮ┤вЪгьЋю В▓аьЋЎВЮ┤ в░ћвАю ьЌцЖ▓ћ В▓аьЋЎВЮ┤вЮ╝Ж│а в╣ёьїљьЋювІц. ВЌГВѓгВЮў ВъљЖИ░ ВЎёЖ▓░Вё▒ВЮё ьЎЋВІаьќѕвЇў ьЌцЖ▓ћ В▓аьЋЎВЮђ ВаѕвїђВаЋВІаВЮ┤ ВЌГВѓг ВєЇВЌљВёю ВъљВІаВЮё ВІцьўёьЋўЖ│а вЊювЪгвѓИвІцвіћ ВДёв│┤ вѓЎЖ┤ђвАаВЮё ьј╝В╣ювІц. РђўВ▓аьЋЎВЮђ ВъљЖИ░ ВІювїђВЮў ВѓгВюавІцРђЎвЮ╝віћ в░ЕВІЮВю╝вАю В▓аьЋЎЖ│╝ ВЌГВѓгьЋЎВЮё ВЮ╝В╣ўВІюьѓцвіћ ьЌцЖ▓ћВЮђ ВЌГВѓгВЎђ ВЮИЖ░ё ВаЋВІаВЮў в░юВаё Ж│╝ВаЋВЮё ВЮ┤ьЋ┤ьЋўвіћ Ж▓ЃВЮ┤ в░ћвЦИ РђўЖхљВќЉ(Bildung)РђЎВЮ┤вЮ╝Ж│а в│┤ВЋўвІц. ВЮ┤ВЌљ вІ╣вїђ вЈЁВЮ╝ВЮђ ьЌцЖ▓ћ В▓аьЋЎВЮё ЖхљВќЉВЮў ВаЋВаљВю╝вАю ьЎЋВІаьќѕвІц. ьЋўВДђвДї ВЮ┤вЪгьЋю ВЌГВѓгВБ╝ВЮўВаЂ ВъљвДїВІгВЮђ ВЌГВѓгВЎђ ьўёВъгвЦ╝ РђўВЎёЖ▓░вљю ВДёвдгВЮў ВІцьўёРђЎВю╝вАю Ж░ёВБ╝ьЋеВю╝вАюВЇе в»ИвъўВЮў В░йВА░ Ж░ђвіЦВё▒ВЮё ьЈљВЄёьЋ┤ в▓ёвд░вІц. ВЮ┤вЪгьЋю ЖхљвДїьЋю ЖхљВќЉВЮђ Ж│╝Ж▒░вЦ╝ ВДёВаЋВю╝вАю в╣ёьїљьЋўЖ│а ьўёВъгвЦ╝ В░йВА░ВаЂВю╝вАю ВЌ┤Вќ┤Ж░ѕ ЖхљВќЉВЮ┤ ВЋёвІѕвЮ╝ ьўёВъгВЮў ЖХїВюёвАю вфевЊа Ж▓ЃВЮё в┤ЅьЋЕьЋўвіћ ьЃђвЮйьЋю ВъљЖИ░вДїВА▒ВаЂ ВЌГВѓгВБ╝ВЮўвІц. ВЮ┤вЪгьЋю ВЌГВѓгЖ┤ђВЮђ ВўѕВѕаВЮ┤вѓў ВбЁЖхљ вХёВЋ╝вЦ╝ ВЌГВѓгВБ╝ВЮўВЮў вЈёЖхгвАю Вѓ╝Ж│аВъљ ьЋўвЕ░, Ж│╝Ж▒░ Жи╣в│хЖ│╝ ьЋ┤В▓┤вЦ╝ ьєхьЋю В░йВА░ВаЂ в░юВЃЂВЮђ ВќхВЋЋьЋювІц.
вІѕВ▓┤віћ РђўВЌГВѓгьЋЎ=В▓аьЋЎРђЎВю╝вАю в│┤віћ ьЌцЖ▓ћ В▓аьЋЎВЮђ ВЌГВѓгвЦ╝ РђўВъљЖИ░ВІцьўёВЮў Ж░ювЁљРђЎ, Рђўв»╝ВА▒ВаЋВІаВЮў в│ђВдЮв▓ЋРђЎ ЖиИвдгЖ│а РђўВхюьЏёВЮў ВІгьїљРђЎВю╝вАю ЖиюВаЋьќѕвІц. РђўВъљЖИ░ ВъљВІаВЮё ВІцьўёьЋўвіћ Ж░ювЁљРђЎВю╝вАю в│┤віћ ВЌГВѓгЖ┤ђВЌљВёю В▓аьЋЎВаЂ РђўЖ░ювЁљ(Begriff)РђЎВЮђ ВЌГВѓгВаЂ РђўВаЋВІа(Geist)РђЎВЮ┤вІц. Ж░ювЁљВЮё ьєхьЋю ВЌГВѓг ВЮИВІЮВЮђ Ж│Д ВаЋВІаВЮў ВъљЖИ░ ВЮ┤ьЋ┤ВЮ┤вЕ░ ВъљЖИ░ВІцьўёВЮў Вџ┤вЈЎВЮ┤вІц. Ж░ювЁљ Ж│Д ВаЋВІаВЮў ВъљЖИ░ВІцьўёВю╝вАюВёю ВЌГВѓгвіћ вўљьЋю Рђўв»╝ВА▒ВаЋВІаВЮў в│ђВдЮв▓Ћ(die Dialektik der Völkergeister)РђЎВЮ┤вІц. ВёИЖ│ёВѓгЖ░ђ Ж│Д в»╝ВА▒ВаЋВІа(Völkergeist)ВЮў вг┤вїђЖ░ђ вљеВю╝вАюВЇе в»╝ВА▒ВаЋВІаВЮў ВЃЂьўИ Ж░ѕвЊ▒Ж│╝ ВХЕвЈїВЮђ вЇћ вєњВЮђ вІеЖ│ёВЮў ВъљВюаВЎђ ВЮ┤Вё▒ВЮё ВІцьўёьЋўЖИ░ ВюёьЋю Жи╣в│хЖ│╝ВаЋВЮ┤ вљювІц. ЖиИвдгЖ│а ьЌцЖ▓ћ В▓аьЋЎВЌљВёю ВёИЖ│ёВѓгвіћ вўљьЋю РђўВёИЖ│ё ВІгьїљ(Weltgericht)РђЎ(359Вфй В░ИВА░)ВЮ┤вІц. ВЎювЃљьЋўвЕ┤ Ж░Ђ в»╝ВА▒Ж│╝ ЖхГЖ░ђвіћ ВЌГВѓг вг┤вїђВЌљВёю ВъљЖИ░ ВѓгвфЁВЮё вІцьЋўВДђ вф╗ьЋа вЋї (в│ђВдЮв▓ЋВаЂВю╝вАю) Ж▓░ЖхГ ВєївЕИ(ВІгьїљ)вІ╣ьЋа Вѕўв░ќВЌљ ВЌєвІц. ВЮ┤вЪгьЋю ВёИЖ│ёВѓгвіћ в░ћвАю ВЮ┤Вё▒ВЮў ВъљЖИ░ вфЕВаЂВЮИ РђўВъљВюаРђЎВЮў ВІцьўёВЮё ьќЦьЋю ВаЋВЮўвАюВџ┤ ВІгьїљВЮў Ж│╝ВаЋВЮ┤вІц. ВЮ┤вЪгьЋю ьЌцЖ▓ћВЮў ВЌГВѓгВ▓аьЋЎВЌљ вїђьЋ┤ вІѕВ▓┤віћ ве╝Вађ ВЌГВѓгВЎђ ьўёВъгвЦ╝ ВаѕвїђьЎћьЋўВЌг ьўёВъгЖ░ђ Ж│Д ВхюЖ│аВЮў ВДёвдгВЮИ Ж▓ЃВ▓ўвЪ╝ в│┤ВЮ┤віћ В░ЕЖ░ЂВЮё ВЋ╝ЖИ░ьЋювІцЖ│а ВДђВаЂьЋювІц. ВЮ┤вЪгьЋю ВЌГВѓгВ▓аьЋЎВЮђ вфевЊа Ж▓ЃВЮё ьЋЕвдгВаЂ ВЮ┤Вё▒ВЮ┤ ВБ╝Ж┤ђьЋўвіћ ВЌГВѓгВаЂ ьЋёВЌ░Вё▒ ВєЇВю╝вАю ьЎўВЏљьЋ┤ в▓ёвдгвЕ┤Вёю в»Ивъў В░йВА░ВЮў Ж░ђвіЦВё▒ВЮё ВЏљВ▓юВаЂВю╝вАю В░евІеьЋювІцЖ│а в╣ёьїљьЋювІц. ВЮ┤вЪгьЋю ьЃювЈёвіћ В░йВА░ВЌљ ВюаВЮхьЋю в╣ёьїљЖ│╝ ЖхљВќЉВЮё ВќхВЋЋьЋўЖ│а ьїївЕИьЋўвіћ ВЌГВѓгВБ╝ВЮўВаЂ ЖхљвДїВЮё вѓ│ЖИ░ вЋївгИВЮ┤вІц.
вІѕВ▓┤віћ ВЌГВѓгВБ╝ВЮўВЌљ вїђьЋю ьЎЋВІаЖ│╝ ВѕГв░░вЦ╝ вўљьЋю РђюВЌГВѓгВаЂ ЖХїваЦВЮў ВбЁЖхљРђЮ(360)вАю ЖиюВаЋьЋўвЕ┤Вёю ВЮ┤вЪгьЋю ВбЁьїївЊцВЮђ РђюьЈГваЦ ВєЇВЌљ вЊцВќ┤ Въѕвіћ ьЈГваЦ ЖиИ ВъљВ▓┤вЦ╝ ВѕГв░░ьЋеВю╝вАюВЇе В▓юЖхГЖ│╝ ВДђВЃЂВЮў вфевЊа ьЈГваЦВЮё ьЈгЖИ░ьЋўвіћ Ж▓ЃРђЮ(360)ВЮ┤вЮ╝Ж│а в╣ёьїљьЋювІц. РђўьЈГваЦ ЖиИ ВъљВ▓┤ВЌљ вїђьЋю ВѕГв░░РђЎвъђ ьі╣ВаЋ ЖХїваЦВЮў Вў│Ж│а ЖиИвдёВЮ┤вѓў ВаЋВЮў(ТГБуЙЕ, Gerechtigkeit) ВЌгвХђвЦ╝ вХёв│ёьЋўВДђ ВЋіЖ│а ьъў Въѕвіћ ЖХїваЦВЮ┤ЖИ░ вЋївгИВЌљ вг┤ВА░Ж▒┤ ВѕГв░░ьЋўвіћ Ж▓ЃВЮё вДљьЋювІц. ВЮ┤вЪгьЋю ьЌцЖ▓ћВІЮ ВЌГВѓгВБ╝ВЮў ВѕГв░░ВъљвЊцВЮђ ЖиИ ьЈГваЦВЮё ВдљЖИ░віћ вЊ» ВЌГВѓгВаЂВю╝вАю вХёвЁИВЎђ ВЌ┤ВаЋВЮў Ж│╝ВаЋвЈё вДѕВ╣ў Ж┤ђвїђьЋўЖ▓ї ВѕўВџЕьЋўЖ▓авІцвіћ ьЃювЈёвЦ╝ в│┤ВЮ┤вЕ┤Вёю ьўёвїђВЮў вІцВќЉьЋю ВѓХВЮў вЈЎваЦвЊцВЮё вгхВѓ┤ьЋ┤ в▓ёвд░вІц. ВЌГВѓгвЦ╝ ВЮ┤вЁљ(ВЮ┤Вё▒)ВЮў ВъљЖИ░ ВаёЖ░ю Ж│╝ВаЋВю╝вАю в│┤Ж│а РђўьўёВІцВаЂВЮИ Ж▓ЃВЮђ ВЮ┤Вё▒ВаЂВЮИ Ж▓ЃВЮ┤вЕ░, ВЮ┤Вё▒ВаЂВЮИ Ж▓ЃВЮђ ьўёВІцВаЂВЮИ Ж▓ЃРђЎВю╝вАю ЖиюВаЋьЋўвіћ ьЌцЖ▓ћВЮў ВЌГВѓгВБ╝ВЮўвіћ ВъљЖИ░ ВІювїђвЦ╝ ВЮИЖ░ё ВъљВюаЖ░ђ ВЌГВѓгВаЂВю╝вАю ВЎёВё▒вљўВЌѕвІцЖ│а в│┤віћ вДцВџ░ ВюёьЌўьЋю ВЌГВѓгЖ┤ђВЮ┤вІц. ВЮ┤вЊцВЮђ ВбЁЖхљ вїђВІа РђўВЌГВѓгРђЎвЦ╝ ВЃѕвАюВџ┤ ВІаВю╝вАю ВѕГв░░ьЋўвіћ ВІаьЎћВаЂ ЖхгВА░вЦ╝ Ж░ђВДђЖ│а ВъѕвІц. ВЮ┤вЊцВЮђ РђўВЌГВѓгВаЂ ьЋёВЌ░Вё▒РђЎВЮ┤вѓў РђўВДёв│┤ВЮў ВЮ┤вЁљРђЎВЮё ВѕГв░░ьЋўЖ│а ВЮ┤вЦ╝ ВаѕвїђьЎћьЋўвЕ░ вг┤в╣ёьїљВаЂВю╝вАю в│хВбЁьЋювІц.
вІѕВ▓┤Ж░ђ в│╝ вЋї вІ╣вїђВЮў ВЌГВѓгьЋЎВъљвЊцЖ│╝ ВДђВІЮВЮИвЊцВЮђ ВЌГВѓгвЦ╝ ВІаВё▒ьЎћьЋўЖ│а ВЮ┤Ж▓ЃВЮё ьєхВ╣ў ЖХїваЦВю╝вАю ВѕГв░░ьЋўЖ│а ЖиИвЪгьЋю ЖХїваЦВЌљ в│хВбЁьЋўвіћ Ж▓ЃВЮё в»ИвЇЋВю╝вАю В░ЕЖ░ЂьЋўвіћ ВъљвЊцВЮ┤ВЌѕвІц. ВЌГВѓг┬иЖХїваЦ┬иВДёв│┤┬иВЮ┤вЁљ ВѕГв░░Ж░ђ ВІювїђВЮў Ваѕвїђ ВбЁЖхљвАю вЉћЖ░ЉьЋю ВюёьЌўьЋю ВЃЂьЎЕВЮ┤ВЌѕвІц. ВЮ┤вЪгьЋю вХёВюёЖИ░віћ ьі╣ьъѕ вЈЁВЮ╝ ВѓгьџїВЌљВёю ВБ╝вЈёВаЂ Ж░ђВ╣ў В▓┤Ж│ёвАю Въљвдг ВъАВЋўВю╝вЕ░, ВЮ┤вЪгьЋю ВЌГВѓгВБ╝ВЮўВЌљ Вќ╝вДѕвѓў ВѕюВбЁьЋўвіљвЃљЖ░ђ РђўЖ░ЮЖ┤ђВаЂ ВДёвдгРђЎвЦ╝ вћ░вЦ┤віћ РђўВЮ┤ьЃђВаЂ вЈёвЇЋРђЎВЮё ВІцВ▓юьЋўвіћ ВъљЖ░ђ вљўвіћ ВаёВ▓┤ВБ╝ВЮўВЮў вѓўвЮйВю╝вАю ьќЦьЋўЖ│а ВъѕВЌѕвІц.
<279ьўИВЌљВёю Ж│ёВєЇ>
|
ЖИђВЊ┤ВЮ┤ ьћёвАюьЋё ЖИђВЊ┤ВЮ┤ : в░ЋьЎЇЖИ░ в░ЋВѓг (ВБ╝ьЋё В▓аьЋЎв░ЋВѓг в»ИЖхГ ВўцВЮ┤ВйћВіцвїђьЋЎЖхљ ЖхљВѕў) ВЮ┤вЕћВЮ╝ : |
 ВЮ╝ьЮћ ьЋўвѓў. В▓аьЋЎ, ВІаьЋЎВЮў ВІювЁђВЮИЖ░ђ? ВІаьЋЎ, В▓аьЋЎВЮў ВІювЁђВЮИЖ░ђ? ВЮ╝ьЮћ ьЋўвѓў. В▓аьЋЎ, ВІаьЋЎВЮў ВІювЁђВЮИЖ░ђ? ВІаьЋЎ, В▓аьЋЎВЮў ВІювЁђВЮИЖ░ђ? |
 ВЮ╝ьЮћ:вАювДѕВаюЖхГВЮў Вџ░ВЃЂ ВѕГв░░ВЎђ В▓аьЋЎ, вАювДѕ Ж░ђьєевдГВю╝вАю вЉћЖ░Љ (1) ВЮ╝ьЮћ:вАювДѕВаюЖхГВЮў Вџ░ВЃЂ ВѕГв░░ВЎђ В▓аьЋЎ, вАювДѕ Ж░ђьєевдГВю╝вАю вЉћЖ░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