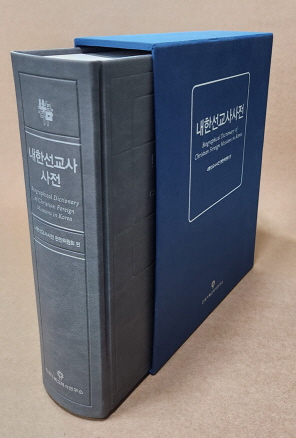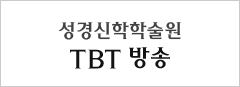쉽게 읽었으나 쉽게 털어낼 수 없는 글, 무진기행

좋아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는 것은 축복이라고들 한다.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 이를테면, 글쟁이가 되고픈 꿈을 가진 내가 다른 글쟁이들이 지은 책을 열었을 때 오는 좌절의 고통이랄까. 도대체 뭘 먹으면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내가 해야 할 노력의 상한선은 어디까지 일까. 과연 내게 재능이란 것이 있기는 한 걸까? 나는 언제쯤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대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기나 한 걸까? 물론 그 순간의 좌절은 책을 읽을 때의 즐거움으로 상쇄하고도 남음이며 그 정도의 좌절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좌절이랄 것도 없는 수준에 그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스스로를 명랑하게 위로할 수 없을, 아주 대단한 글을 읽고 나니 좌절을 넘어서 일종의 ‘체념’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나는 감히 이만큼 쓰지도 못 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연민보다 작가에 대한 감탄과 존경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그는 내게 있어 질투나 부러움 혹은 목표의 영역 속에 있지 않다. 언감생심 질투라곤 꿈도 꿀 수 없는, 독보적이고 고상한 높이에 자리해 있다. 김승옥. 바로 <무진기행>의 작가이다.
나쁜 글은 통속적인 싸구려 감상을 자아내 순간의 감정적 통쾌를 느끼게 하지만, 좋은 글은 오랜 시간 정성으로 빚은 도자기처럼 청아한 아름다움으로, 쉽게 지워질 수 없는 감동을 안겨 준다. <무진기행>의 책장을 덮을 때 콧잔등이 시큰하고 가슴이 얼얼해지던 경험은 참 오랜만에 해본 것이었다. 그 때의 감격과, 애틋함을 온전하게 풀어낼 수 없음에 한계를 느낀다.
이 책은 <무진기행>이라는 동명의 소설을 포함한, 15개의 단편이 실린 소설집이다. 어느 것 하나 순위를 매길 수 없이 주옥같은 글들이지만, <차나 한잔>이라는 소설이 특히 재밌었다. 청년들의 4분의 1이 실업 상태로 있는 시대에, 스스로 백수를 자처하고 있는지라 감정이입이 잘 되었던 탓이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다. 주인공 ‘나’는 연재하던 만화가 몇 주째 신문에 실리지 않아 불안함과 불길함으로 설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신문사를 가던 중에 만난 동네 주민이 그에게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그리는 만화가 실리지 않나보다 하고 위로를 건네지만, ‘나’는 차라리 그런 이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급히 걸음을 옮긴다. 편집국 안에 들어서자 불안은 현실이 된다. 문화부장이, 댁의 만화가 재미가 없는 모양이니 그리기를 그만 두어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다. ‘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몇 번의 굴욕적인 상황을 겪곤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간다.
밥벌이를 하기 위해 모멸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치사해지는 순간을 담담하고 재치 있게 그려놓았다. 디테일이 어찌나 생생한지 읽는 내가 다 얼굴이 붉어질 지경이었다. 어찌됐건,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이었다.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현상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 자존심을 굽히고 웃음을 파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향기롭고 섬세한 글을 출판사에서 출간하도록 내버려둔 채 1981년, 글의 주인 김승옥은 종교적 계시를 받는 극적 체험 후 성경공부와 수도 생활을 시작하며 펜을 놓았다. 그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그의 신비적 체험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태껏 문학계로 귀환하지 않은 데에 그 체험의 대상에 대한 원망스런 마음(!)마저 든다.
작가란 꿈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따로 정해진 ‘메뉴얼’이 없다. 많이 읽고 많이 쓰라 하지만 그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다. (또한 그건 작가가 아닌 사람들도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종의 ‘내공쌓기’ 공부가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을 수도, 잘못되어도 돌아올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다른 두려움으로 나를 이끈다. 앞뒤 분간 할 수 없는 광막한 어둠 속을 겨우 내딛어가는 이런 상황에 누군가는 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작가를 관두었다는 사실이 어쩐지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헌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틀렸다. 어쩌면 사치는 내가 부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 나는 이 말씀의 확고한 논리체계와 깊이를 장차 쓸 소설에 이용하려 하니까 말이다. 누군가는 신을 이용해 꿈을 이루려 하고, 누군가는 신을 영접하기 위해 꿈을 접으니 진정 사치를 부리는 사람은 누군고 싶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내게 재능대신 이 성경신학을 주신 것 같다. 그러니만큼 영리하고 조리 있게 써먹어야 겠다. 열 사람의 재능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고 우월한 선물이 아닌가.








 <유지니아> 섬뜩한 아름다움에 매료당한 가을 밤
<유지니아> 섬뜩한 아름다움에 매료당한 가을 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