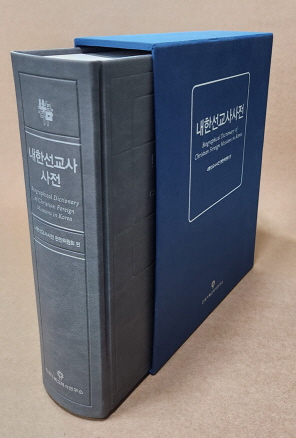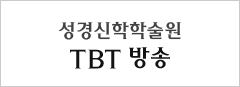내가 저지르고, 내가 책임지기
영화 <러브 앤 프렌즈>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새삼 많음을 깨닫는다. 가까운 관계가 걸쳐진 일들이라면 더더욱. 중요한 일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의외로) 의존적이라는 사실에 약간 좌절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의 파편을 이 영화를 통해 들여다 본 것 같아 위로 아닌 위로를 얻었다.
레이첼은 전형적인 시녀병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까지 가진 여자다. 가장 친한 친구의 약혼자인 덱스가 실은 대학시절 짝사랑이었던 것. 그와의 마음을 새삼 확인하지만, 모든 결정은 뒤로 유보한 채 ‘친구의 결혼’이란 과업 뒤에 숨어 버린다. 레이첼을 좋아했던 마음을 숨겨왔던 덱스도 마찬가지. 그 둘이 그 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니, 중요한 결정은 모두 상대에게 ‘떠넘겼다’는 데 있었다. 친구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던 레이첼, 친구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다 해주고 양보했던 레이첼. 상황을 좀 더 클리어하게 만들 용기와 의지가 부족했던 덱스. 결국 그 순간의 번거로움을 모면하기 위해, 당장 편하기 위해 했던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인 것. 만약 한 명이라도 선명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영화를 보는 내내, 왜 저들은 자신의 사랑에 있어 방관자의 역할을 자처할까 싶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체성의 문제란 생각이 들었다.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끝내는 것도, 우정을 이어가는 것도, 결혼의 문제도 상황이나 타인이 아닌 본인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핑계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지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발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있음을 눈치 챘다. 그 결과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대전제이다. 대전제는 말 그대로 대전제일 뿐 모든 상황에 일일이 대입하기엔 그 간극이 크다.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 맞출 경우 큰 오류가 생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책임의 문제다. 고통 혹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자에게 미루면 편안할 순 있지만, 성장할 순 없다. 미숙한 어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탓’을 일삼는다는 데에 있다. 실수했다면 뉘우치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라니.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면피를 하는 데에도 쓰임 당하신다. 부족한 나, 나약한 나, 찌질한 나를 마주하는 일은 물론 괴롭지만 그 괴로움의 시간을 올곧게 흡수한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자랄 수 있다. 성숙한 신앙적 태도는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서 언급한 주체, 그리고 결자해지도 이런 의미에서다.
아마 영화 속 레이첼은 이 부분을 깨달았던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용기 내어 덱스에게 고백하지만 슬프게도 바로 까인(!)다. 덱스도 복잡했을 것이다. 결혼은 일대일이 아니라 패밀리 대 패밀리니까. ‘집안 체면’ 운운하는 아버지, 눈치만 보는 어머니. 부모님을 설득하고 투쟁하는 과정들이 피곤했던,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기를 관둔 덱스.
그리고 레이첼은 영국으로 떠난다. 그 곳에서 한 뼘 더 자라고, 한 뼘 더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제 덱스에 한정되었던 그녀의 시야가 좀 더 트인다. 결혼식에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덱스에 대한 알량한 원망이나 복수심이 아니다. 하나 뿐인 친구 달시에게 상처주지 않기 위해, 그녀를 축하해주기 위해 일어서는 것. 뭐 그 이후엔 약간의 해프닝이 있고 해피엔딩이다.
물론 영화는 레이첼과 덱스가 순순히 이어지도록 해주진 않는다. 달시가 둘의 관계를 눈치 챈 것. 발악하다시피 화를 내고 떠나간 달시를 두 달 후에 길에서 마주친다. 이 때 레이첼은, 예전처럼 달시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는 레이첼이 아니기에 당당하게 말한다. 너에게 너무나 미안해. 그리고, 매일 그립다 라고.
<러브 앤 프렌즈>라는 로맨스 영화는, 무언가를 결정함에 주도권을 붙들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로맨스란 이름으로 엮어놓은 사례집 같았다. 냉정하고 똑부러지게 조언해주는 레이첼의 친구 이든은, 정확히 사리 분별을 하게끔 상황의 외피를 걷어내고 뼈대를 보여주는 이성의 또 다른 이름.
내 결정에 대해 타인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된 거다. 그리고 그 ‘옳음’이 꼭 정의여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항상 100%가 공감해 줄 거란 기대, 그 100%라는 허구의 힘을 등에 업은 용기. 그런 건 다 가짜다. 결국 싸우는 것도, 결과에 책임지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 그냥 나를 믿어야지. 나 혼자로도 괜찮다. 그 자신감 근저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것이다.







 상식과 기본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
상식과 기본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 영웅이 뭡니까
영웅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