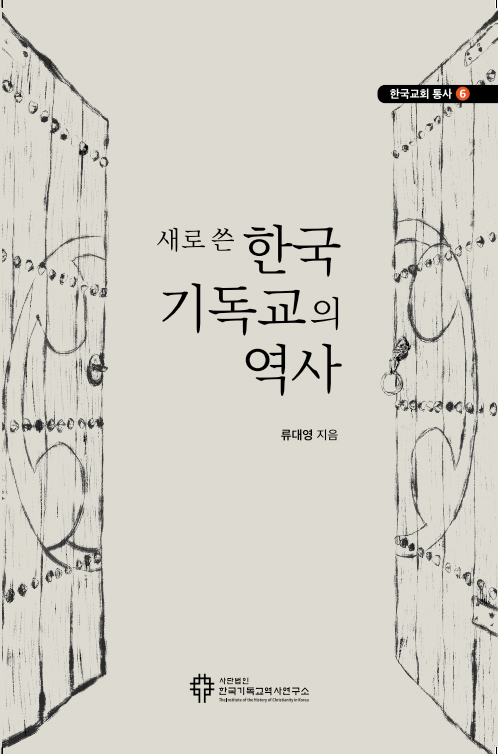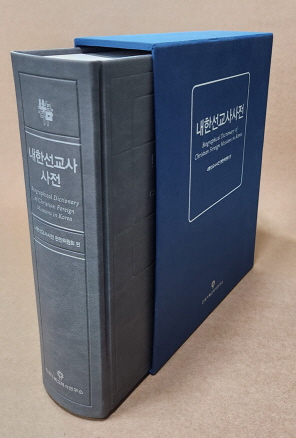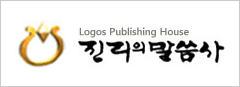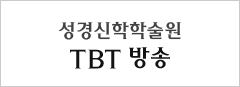мӢ н•ҷ
л°”лҘҙнҠёмқҳ көҗмқҳн•ҷ, көҗмқҳ к°ңл…җ
л°”лҘҙнҠёлҠ” гҖҺкөҗнҡҢкөҗмқҳн•ҷгҖҸ I/1, В§1. вҖңкөҗмқҳн•ҷмқҳ кіјм ңвҖқм—җм„ң вҖҳкөҗмқҳн•ҷвҖҷмқҳ к°ңл…җмқ„ м •лҰҪн–ҲлӢӨ. 1. вҖңкөҗнҡҢ, мӢ н•ҷ, н•ҷл¬ёвҖқм—җм„ң көҗнҡҢмқҳ н•ҷл¬ёмқё мӢ н•ҷмқ„ мқјл°ҳмҳҒм—ӯмқҳ н•ҷл¬ё мҲҳмӨҖкіј лҸҷмқјн•ҳкІҢ лҶ“м•ҳлӢӨ. л°”лҘҙнҠёлҠ” вҖңк·ёлҰ¬мҠӨлҸ„көҗм Ғ мІ н•ҷ(Philosophia christiana)вҖқмқ„ көҗмқҳн•ҷмңјлЎң к·ңм •н•ҳкі , н•ҷл¬ёкіјмқҳ кІҪкі„лҘј көҗл¬ҳн•ҳкІҢ мҡ©мқён–ҲлӢӨ(fur die Theologie nicht tragbaren Wissenschafts-begriffs mit sich selbst zur Kirche rechnet). л°”лҘҙнҠёлҠ” л§ҢмӢ м „мқҖ кұ°л¶Җн•ҳл©ҙм„ң, н•ҷл¬ёкіј мӢ н•ҷмқ„ лӢЁм ҒмңјлЎң кө¬л¶„н•ҳлҠ” кІғмқҖ мҡ©мқён–ҲлӢӨ(GG., 37: KD., 10. Eine Begrundung dieses Glaubens kommt nicht in Betracht, aber seine Verleugnung noch weniger. Seine Verleugnung konnte aber der Sinn einer allzu reinlichen Unterscheidung der Theologie von den вҖқWissenschaftenвҖң rein).
л°”лҘҙнҠёлҠ” гҖҺкөҗнҡҢкөҗмқҳн•ҷгҖҸ I/1, В§1. вҖңкөҗмқҳн•ҷмқҳ кіјм ңвҖқлҠ” 1. көҗнҡҢ, мӢ н•ҷ, н•ҷл¬ём—җм„ң 2. нғҗкө¬лЎңм„ңмқҳ көҗмқҳн•ҷ(DOGMATIK ALS FORSCHUNG), 3. лҜҝмқҢ н–үмң„лЎңм„ң көҗмқҳн•ҷмңјлЎң 진н–үн•ңлӢӨ.
л°”лҘҙнҠёлҠ” көҗмқҳн•ҷ(dogmatics)кіј көҗмқҳ(Dogma)мқҳ к°ңл…җмқ„ лӘ…нҷ•н•ҳкІҢ м ңмӢңн•ңлӢӨ. Dogmatik ist die Selbstprufung der christlichen Kirche hinsichtlich des Inhalts der ihr eigentumlichen Rede von Gott. Den gesuchten Rechten Inhalt dieser Rede nennen wir вҖқdas DogmaвҖң. көҗмқҳн•ҷмқҖ мӢ м—җ кҙҖн•ң көҗнҡҢмқҳ л§җн•Ё лӮҙмҡ©(Rede von Gott, talk about God)м—җ лҢҖн•ң кё°лҸ… көҗнҡҢмқҳ мһҗкё° кІҖмҰқмқҙлӢӨ. мқҙлҹ¬н•ң л§җн•Ё(Rede, word)мқҳ 추кө¬лҗң мҳ¬л°”лҘё лӮҙмҡ©мқ„ мҡ°лҰ¬лҠ” көҗмқҳ(Dogma)лқјкі м№ӯн•ңлӢӨ(GG., 37). л°”лҘҙнҠёлҠ” вҖҳкөҗмқҳн•ҷ(dogmatics)вҖҷм—җ лҢҖн•ҙм„ңлҠ” В§7(н•ҳлӮҳлӢҳмқҳ л§җм”Җ, көҗмқҳ, көҗмқҳн•ҷ)м—җм„ң м„ӨлӘ…н• мҳҲм •мқҙлӢӨ.
л°”лҘҙнҠёлҠ” көҗмқҳн•ҷкіј көҗмқҳлҘј мҳ¬л°”лҘё лӮҙмҡ©м—җ лҢҖн•ң мһҗкё° кІҖмҰқ(Selbstprufung, self-examination)мқҙлқјкі к°ңл…җнҷ”н–Ҳкё° л•Ңл¬ём—җ, к·ё к°ңл…җ мң„м—җм„ң көҗмқҳн•ҷмқ„ вҖҳнғҗкө¬(Enquiry)вҖҷлЎң к·ңм •н•ңлӢӨ.
л°ҳнӢё л°•мӮ¬(Cornelius Van Til, 1895–1987)лҠ” м№ј л°”лҘҙнҠё(Karl Barth, 1886-1968) мӢ н•ҷмқ„ лҢҖн•ӯн•ҙм„ң к°ңнҳҒнҢҢ мӢ н•ҷмқ„ ліҖнҳён•ң лҢҖн‘ң л°©нҢҢм ңмқҙлӢӨ. мӣЁмҠӨнҠёлҜјмҠӨн„°мӢ н•ҷкөҗмқҳ к·ёл Ҳмғҙ л©”мқҙмІң(John Gresham Machen, 1881-1937)мқҖ мһҗмң мЈјмқҳ мӢ н•ҷмқ„ лҢҖн•ӯн•ҳм—¬ ліҖнҳён•ң лҢҖн‘ң л°©нҢҢм ңмқҙлӢӨ. мӣЁмҠӨнҠёлҜјмҠӨн„°мӢ н•ҷкөҗлҠ” л°ҳнӢё л°•мӮ¬ мқҙнӣ„ м№ј л°”лҘҙнҠё мӢ н•ҷмқ„ л°ҳнӢёмІҳлҹј л°©м–ҙн•ҳм§Җ лӘ»н–ҲлӢӨ. кІ°көӯ мӣЁмҠӨнҠёлҜјмҠӨн„°мӢ н•ҷкөҗлҠ” мІӯкөҗлҸ„мЈјмқҳлҘј нҸ¬мҡ©н•ҳлҠ” мӢ н•ҷ мЎ°лҘҳм—җ м№ј л°”лҘҙнҠё л°Ҹ нҳ„лҢҖмӢ н•ҷмқ„ 비нҸүн•ҳл©° мҲңмҲҳ мӢ н•ҷмқ„ ліҖнҳён•ҳлҠ” мқјмқ„ мҲҳн–үн•ҳм§Җ м•ҠлҠ”лӢӨ. м№ј л°”лҘҙнҠё мӢ н•ҷмқҖ л°•нҳ•лЈЎ л°•мӮ¬мҷҖ л°ҳнӢё л°•мӮ¬м—җкІҢ мқөнһҢ м„ңмІ мӣҗ л°•мӮ¬к°Җ л„ӨлҚңлһҖл“ң мһҗмң лҢҖн•ҷкөҗ(Vrije Universiteit, Free Univ)мқҳ лІ мқёнҳён”„(Jan Veenhof, 1934-2024)мқҳ м§ҖлҸ„ м•„лһҳм„ң л°”лҘҙнҠёлҘј 비нҢҗн•ҳлҠ” лӮҙмҡ©мқҙ мһҲлҠ” л…јл¬ёмңјлЎң л°•мӮ¬н•ҷмң„лҘј м·Ёл“қн–ҲлӢӨ(1982л…„). лІ мқёнҳён”„лҠ” м№ј л°”лҘҙнҠёк°Җ л°”м Өм—җм„ң к°•мқҳм—җ м°ём„қн•ҳмҳҖкі , л°”лҘҙнҠёлҘј мҳ№нҳён•ҳлҠ” л°ңнӢ°м•Ҳ(Barthian)мқҙлӢӨ. мһҗмң лҢҖн•ҷкөҗлҠ” лІ лҘҙм№ҙмҡ°мӣҢ(G. C. Berkouwer, 1903-1996), н—Ёл“ңлҰӯмҠӨ лІ лҘҙнҒ¬нҳён”„(Hendrikus Berkhof, 1914-1995) л“ұмқҙ л°”лҘҙнҠё мӢ н•ҷмқ„ мҳ№нҳён•ҳл©°, мһҗмң лҢҖн•ҷкөҗлҘј л°”лҘҙнҠёмЈјмқҳ мӢ н•ҷмңјлЎң кө¬м„ұн–ҲлӢӨ. м№ј л°”лҘҙнҠё мӢ н•ҷмқ„ к°ҖмһҘ мІҙкі„м ҒмңјлЎң 비нҸүн•ң м—°кө¬мһҗлҠ” м„ңмІ мӣҗ л°•мӮ¬мқј кІғмқҙлӢӨ. л°•нҳ•лЈЎ л°•мӮ¬(1897-1978)лҠ” м„ұкІҪм—җ лҢҖн•ҙм„ң(мқҙлӢӨ(is)мҷҖ лҗңлӢӨ(become)) 비нҢҗн–ҲлӢӨ. л°ҳнӢё л°•мӮ¬лҠ” м№ј л°”лҘҙнҠё мӢ н•ҷмқҳ кё°лҸ…лЎ м—җ лҢҖн•ҙм„ң 비нҸүн•ҳл©° кұ°л¶Җн–ҲлӢӨ. к·ёлҰ¬кі м„ңмІ мӣҗ л°•мӮ¬лҠ” л°”лҘҙнҠё мӢ н•ҷмқҙ мӮјмң„мқјмІҙк°Җ м—ҶмқҢ нҳ№мқҖ л¶Җм •н•Ё, мқёк°„мҳҲмҲҳлҘј к·јкұ°н•ң мғҒмҠ№кё°лҸ…лЎ мңјлЎң 비нҸүн–ҲлӢӨ.
л°•нҳ•лЈЎ, мҪ”넬лҰ¬мҡ°мҠӨ л°ҳнӢё, м„ңмІ мӣҗ л“ұмқҖ к°ңнҳҒнҢҢ мӢ н•ҷмһҗлЎң көҗмқҳ(Dogma)м—җ лҢҖн•ң к°ңл…җмқҙ к°ҷлӢӨ. к·ёлҹ°лҚ° м№ј л°”лҘҙнҠёлҠ” көҗмқҳм—җ лҢҖн•ң к°ңл…җмқ„ мғҲлЎӯкІҢ н–ҲлӢӨ. к·ёлһҳм„ң л°ҳнӢё л°•мӮ¬к°Җ м ңм–ён•ң м „м ңмЈјмқҳ(Presuppositionalism)лҘј кё°м–өн•ҙм•ј н•ңлӢӨ. н•„мһҗлҠ” л°ҳнӢёмқҳ м „м ңмЈјмқҳлҠ” мӮ¬мң мқҳ м „м ңк°Җ лӢӨлҘҙлӢӨлҠ” мЈјмһҘмқҙлӢӨ. лҢҖн‘ңм Ғмқё к·ңм •мқҖ м°Ҫм„ёкё°мқҳ м•„лӢҙмқҳ мӢӨмһ¬м„ұ, м„ м•…кіј л“ұмқҳ мӢӨмһ¬м„ұм—җ лҢҖн•ҙм„ң м „м ңк°Җ лӢӨлҘҙлӢӨ. л°”лҘҙнҠёлҠ” м—ӯмӮ¬мҷҖ мҙҲм—ӯмӮ¬(Urgeschichte) к°ңл…җмқ„ нҶөн•ҙ м°Ҫм„ёкё° кё°мӮ¬лҘј н•ҙм„қн–ҲлҠ”лҚ°, мқҙлҠ” л°ҳнӢёмқҙ ліҙкё°м—җ м„ұкІҪмқҳ к°қкҙҖм Ғ 진лҰ¬м„ұмқ„ м•Ҫнҷ”мӢңнӮӨлҠ” кІғмқҙм—ҲлӢӨ. л°”лҘҙнҠёмқҳ м ‘к·јлІ•мқҖ нҳ„лҢҖм Ғ м—ӯмӮ¬ 비нҢҗн•ҷкіј нғҖнҳ‘н•ҳл©ҙм„ң м„ұкІҪмқҳ л¬ёмһҗм Ғ 진лҰ¬лҘј нҸ¬кё°н•ңлӢӨкі л°ҳнӢёмқҖ нҢҗлӢЁн–ҲлӢӨ. к·ёлһҳм„ң м „м ң, мӮ¬мң мқҳ кё°мҙҲк°Җ м „нҳҖ лӢӨлҘҙлӢӨ. к·ёлҹ°лҚ° л°”лҘҙнҠёмқҳ Dogmaмқҳ к°ңл…җ, м „м ңк°Җ лӢӨлҘҙлӢӨлҠ” кІғк№Ңм§ҖлҠ” л°қнһҲм§Җ м•Ҡм•ҳлӢӨ.
м„ңмІ мӣҗ л°•мӮ¬лҠ” көҗлҰ¬(Dogma)лҘј мӮјмң„мқјмІҙ, к·ёлҰ¬мҠӨлҸ„ м–‘м„ұкөҗлҰ¬(н•ң мң„кІ©м—җ л‘җ ліём„ұ), мқҙмӢ м№ӯмқҳлЎң к°ңл…җнҷ”н–ҲлӢӨ. к·ёлҹ°лҚ° л°”лҘҙнҠёлҠ” көҗмқҳ(Dogma)лҘј вҖңн•ҳлӮҳлӢҳм—җ кҙҖн•ҙм„ң л§җн•Ём—җм„ң 추кө¬лҗң мҳ¬л°”лҘё лӮҙмҡ©вҖқмңјлЎң к°ңл…җнҷ”н–ҲлӢӨ. л°”лҘҙнҠёмқҳ көҗмқҳ к°ңл…җм—җ к·јкұ°н•ҙм„ң мЎ°м§Җ лҰ°л“ңл°ұ(George A. Lindbeck, 1923-2010)мқҳ гҖҺкөҗлҰ¬мқҳ ліём„ұгҖҸ(The Nature of Doctrine, 1984л…„) л“ұ лӢӨм–‘н•ң м ҖмҲ мқҙ м¶ңк°„лҗҳм–ҙ көҗмқҳмқҳ к°ңл…җмқ„ лӢӨліҖнҷ”мӢңмј°лӢӨ. лҰ°л“ңл°ұмқҖ мҳҲмқј лҢҖн•ҷ мӢ н•ҷл¶Җ көҗмҲҳлЎң м—җнҒҗл©”лӢҲм№ј м „л¬ёк°ҖмҳҖкі , мҳҲмқјн•ҷнҢҢ(Yale School)лҘј мЈјлҸ„н–ҲлӢӨ. мөңлҚ•м„ұ л°•мӮ¬лҠ” мҳҲмқј мң н•ҷ мӢңм Ҳ мҲҳн•ҷн–ҲлӢӨкі н•ңлӢӨ. мөң л°•мӮ¬лҠ” лҰ°л“ңл°ұмқҙ лҸҷм–‘ мң н•ҷмғқмқҙ м–ҙлҰ° мӢңм Ҳ кІҪн—ҳн•ң кІғкіј мҲңмҲҳн•ң ліөмқҢм—җ лҢҖн•ң кі л°ұм—җ лҢҖн•ҙм„ң нқҘлҜёлЎӯкІҢ кІҪмІӯн–ҲлӢӨкі нҡҢкі н–ҲлӢӨ. лҰ°л“ңл°ұмқҖ лЈЁн„°нҢҢ мӢ н•ҷмһҗлЎң 1962л…„ 2м°Ё л°”нӢ°м№ё кіөмқҳнҡҢм—җ м°ём„қн•ң н•ҷмһҗмқҙл©°, нӣ„кё°мһҗмң мЈјмқҳ мӢ н•ҷ(Postliberal Theology)мңјлЎңм„ң, көҗлҰ¬лҘј м–ём–ҙ кІҢмһ„, л¬ёнҷ” м–ём–ҙм Ғ кҙҖм җм—җм„ң мһ¬кө¬мғҒнҷ”н–ҲлӢӨ. м•ЁлҰ¬мҠӨн„° л§Ҙк·ёлһҳмҠӨлҠ” гҖҺкөҗлҰ¬мқҳ кё°мӣҗгҖҸ(The Genesis of Doctrine, 1990л…„)мқ„ м¶ңк°„н–ҲлӢӨ.
л°”лҘҙнҠёлҠ” н•ҳлӮҳлӢҳм—җ лҢҖн•ҙм„ң л§җн•ҳлҠ” кІғ(Redens von Gott)мқҙ көҗнҡҢмқҳ кі мң н•ң кІғмқҙм§Җл§Ң, мҳ¬л°”лҘё лӮҙмҡ©мқ„ мқёмӢқн•ҳлҠ” кІғ нҳ№мқҖ нғҗкө¬н•ҳлҠ” кІғмқ„ көҗмқҳн•ҷмқҙлқјкі н–Ҳкі , к·ё кіјм •м—җм„ң м–»м–ҙ진 л°”лҘё лӮҙмҡ©мқҙ көҗмқҳлқјлҠ” кІғмқҙлӢӨ. л°”лҘҙнҠёлҠ” көҗнҡҢм—җм„ң н–үн•ҙм§ҖлҠ” н•ҳлӮҳлӢҳм—җ кҙҖн•ң л§җн•ЁмқҖ мқёк°„мқҳ нғҗкө¬ лҢҖмғҒмқҙ лҗ мҲҳ мһҲкі , лҢҖмғҒмқҙ лҗ мҲҳ мһҲ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л°”лҘҙнҠёлҠ” мӢ н•ҷмқҳ лҢҖмғҒмқ„ көҗнҡҢм—җм„ң н–үн•ҙм§Җкі мһҲлҠ” н•ҳлӮҳлӢҳм—җ лҢҖн•ҙм„ң л§җн•Ём—җ л‘җм—ҲлӢӨ. к°ңнҳҒнҢҢмқҳ мӢ н•ҷ лҢҖмғҒмқҖ мӣҗнҳ•кі„мӢң(Archetypal Revelation)мҷҖ лӘЁнҳ•кі„мӢң(Ectypal Revelation)м—җм„ң лӘЁнҳ•кі„мӢңм—җ к·јкұ°н•ҙм„ң н•ҳлӮҳлӢҳмқ„ м•„лҠ” кІғмқҙлӢӨ. л°”лҘҙнҠёмҷҖ м„Өкөҗм—җ мӨ‘м җмқ„ л‘җлҠ” мң мӮ¬н•ң нҢЁн„ҙмқҙ мһҲлӢӨ. л°”лҘҙнҠёлҠ” м„ӨкөҗлҘј вҖңн•ҳлӮҳлӢҳм—җ лҢҖн•ҙм„ң л§җн•ЁвҖқмңјлЎң н•ҳм§Җл§Ң, к°ңнҳҒнҢҢм—җм„ң м„ӨкөҗлҠ” вҖңліөмқҢмқ„ м„ нҸ¬н•ЁвҖқмңјлЎң н•ңлӢӨ. лӘЁнҳ•кі„мӢңм—җ мқҳн•ҙм„ң м§Ғм ‘м ҒмңјлЎң мӢ мқ„ кҙҖмЎ°н•ҳлҠ”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лӘЁнҳ•кі„мӢңм—җ к·јкұ°н•ҙм„ң м„ нҸ¬лҗң ліөмқҢмңјлЎң н•ҳлӮҳлӢҳмқҳ л§җм”Җмқ„ кІҪмІӯн•ҳкі мҲңмў…н•ҳлҠ” кө¬лҸ„мқҙлӢӨ. м№ј л°”лҘҙнҠёк°Җ л§җн•ң к·ё л§җн•Ёмқ„ нғҗкө¬н•ҳкі л¶„м„қн•ҙм„ң л°”лҘё лӮҙмҡ©мқ„ нҷ•ліҙн•ҳлҠ”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ҙм§Җл§Ң, м„ұкІҪкі„мӢңм—җ н•©лӢ№н•ң кІғмқём§Җк°Җ м„ӨкөҗлӮҙмҡ©мқҳ м Ғн•©м„ұмқ„ нҸүк°Җн•ҳлҠ” л§Өмҡ° мӨ‘мҡ”н•ң мҡ”мҶҢмқҙлӢӨ. л°”лҘҙнҠёлҠ” көҗнҡҢм—җм„ң н–үн•ҙм§ҖлҠ” мӢ м—җ лҢҖн•ҙм„ң л§җн•Ё мӮ¬кұҙм—җм„ң л°”лҘё лӮҙмҡ©мқҙ л°ңмғқн•ҳл©ҙ көҗмқҳк°Җ лҗң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к·ё лІ”мң„м—җлҠ” м ңм•Ҫмқҙ м—ҶлӢӨ. к·ёлҹ¬лӮҳ к°ңнҳҒнҢҢ мӢ н•ҷмқҖ нғқн•ң лІ”мң„мқҳ м„ұкІҪліёл¬ёкіј м„ нҸ¬лҗң ліөмқҢкіј м—°кҙҖм„ұмқҙ мһҲм–ҙм•ј н•ңлӢӨ.
л°”лҘҙнҠёлҠ” н•ҳлӮҳлӢҳм—җ кҙҖн•ҙ л§җн•ЁмқҙлқјлҠ” м–ём–ҙ мӮ¬кұҙм—җ мЈјлӘ©н•ҳлҠ”лҚ°, мқҙ м–ём–ҙ мӮ¬кұҙмқҖ мқёк°„мқҙ л§җн•ҳлҠ” мӮ¬кұҙмқҙлӢӨ. н•ҳлӮҳлӢҳм—җ кҙҖн•ҙм„ң л§җн•Ёмқҳ н–үмң„м—җм„ң мӮ¬кұҙмқҙ л°ңмғқн•ҙм„ң мҳ¬л°”лҘё лӮҙмҡ©мқҙ л°ңмғқн• мҲҳ мһҲлӢӨ. к·ё лӮҙмҡ©мқҙ көҗмқҳк°Җ лҗңлӢӨ. мҰү л°”лҘҙнҠём—җкІҢ көҗмқҳлҠ” к·ңлІ”м ҒмңјлЎң ліҙмЎҙлҗҳм–ҙ мһҲм§Җ м•ҠлӢӨ. к°ңнҳҒнҢҢ мӢ н•ҷмқҖ кі лҢҖкөҗл¶Җ мӢ н•ҷмқ„ нҡҢліөн•ң нҡҢліөмӢ н•ҷмқҙкі , мӮ¬лҸ„мқҳ к°ҖлҘҙм№Ёмқ„ мң м§Җн•ҳлҠ” м •нҶөмӢ н•ҷмқҙкі , м„ұкІҪ л§җм”Җмқ„ к·ёлҢҖлЎң л°қнһҲкі мҲңмў…н•ҳл ӨлҠ” м„ұкІҪмӢ н•ҷмқҙлӢӨ. к·ёлҹ¬лӮҳ л°”лҘҙнҠёлҠ” н•ҳлӮҳлӢҳм—җ лҢҖн•ҙм„ң л§җн•Ём—җм„ң м–ҙл–Ө к·ңлІ”мқҙлӮҳ н•ңкі„к°Җ м—ҶлӢӨ. көҗнҡҢм—җм„ң л§җн•Ём—җм„ң көҗмқҳк°Җ л°ңмғқн• мҲҳ мһҲлӢӨ. к·ёлһҳм„ң л°”лҘҙнҠём—җкІҢ көҗмқҳлҠ” нҷ•м •м Ғмқҙ м•„лӢҲлқј лҜёлһҳм—җ л°ңмғқлҗ мқҙмғҒм Ғмқё кё°лҢҖм№ҳмқҙлӢӨ. к·ёлҹ¬лӮҳ м •нҶөмӢ н•ҷм—җм„ң көҗмқҳлҠ” кіјкұ°м—җ нҷ•м •лҗң кІғмқҙл©°, ліҖн•ҳм§Җ м•ҠлҠ” лӮҙмҡ©мқ„ лӢҙкі мһҲлҠ” ліҙнҺё көҗнҡҢмқҳ кІ°м •мқҙлӢӨ.
л°”лҘҙнҠёлҠ” мһҗкё° мӮ¬мң мІҙкі„лҘј 진н–үн• л•Ң, к·ё кё°ліё к°ңл…җл“Өмқ„ л„Ҳл¬ҙлӮҳ лӘ…нҷ•н•ҳкІҢ м ңмӢңн•ҳкі мһҲлӢӨ. к·ёлҹ°лҚ° к·ё к°ңл…җл“Өмқ„ 맹종н•ҳлҠ” кІғмқҖ м •нҶөмЈјмқҳм—җ лҢҖн•ң мқҙн•ҙк°Җ м—Ҷкё° л•Ңл¬ёмқҙлӢӨ. л°”лҘҙнҠёлҠ” м •нҶөмӢ н•ҷмқ„ кұ°л¶Җн•ҳкі мһҗкё° мӢ н•ҷмқ„ м„ёмӣ лӢӨ. к·ёмқҳ 추кө¬лҠ” м„ұкіөн–Ҳкі , 20м„ёкё° мқҙнӣ„ 21м„ёкё°к№Ңм§Җ мөңкі мң„м№ҳм—җ мһҲлӢӨ. лӘЁл“ мӢ н•ҷкі„(WCC, WEA)лҠ” к·ёмқҳ к·ёлҠҳм—җ мһҲлӢӨ. л°”лҘҙнҠёк°Җ л§җн•ң көҗмқҳ к°ңл…җмңјлЎң н•ңлӢӨл©ҙ, WCCк°Җ көҗлҰ¬лҘј л– лӮҳ н•ң к°ҖлҘҙм№Ё мІҙкі„лҘј м„ёмҡҙлӢӨкі н• л•Ң мһҗмң лЎӯкІҢ көҗлҰ¬лҘј к°ңл°©н•ҳкі м„ӨлӘ…н•ҙмӨҖлӢӨл©ҙ мўҖ лҚ” л№ лҘҙкІҢ көҗлҰ¬лҘј мқҙн•ҙн• мҲҳ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 м№ј л°”лҘҙнҠёк°Җ л§җн•ң көҗмқҳ(Dogma) к°ңл…җмқҖ к°ңнҳҒнҢҢ мӢ н•ҷм—җм„ң л§җн•ҳлҠ” көҗмқҳ к°ңл…җкіј л„Ҳл¬ҙлӮҳ л§Һмқҙ лӢӨлҘҙлӢӨ.
|
кёҖм“ҙмқҙ н”„лЎңн•„ кёҖм“ҙмқҙ : кі кІҪнғң лӘ©мӮ¬ (мЈјлӢҳмқҳкөҗнҡҢ / нҳ•лһҢм„ңмӣҗ) мқҙл©”мқј : |
 л°”лҘҙнҠё, мһҗмң мЈјмқҳ м—°мҶҚкіј л¶Ҳм—°мҶҚ (2) л°”лҘҙнҠё, мһҗмң мЈјмқҳ м—°мҶҚкіј л¶Ҳм—°мҶҚ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