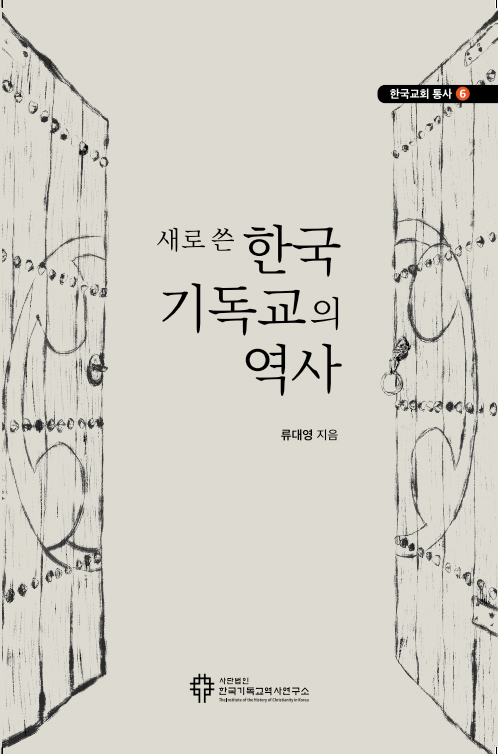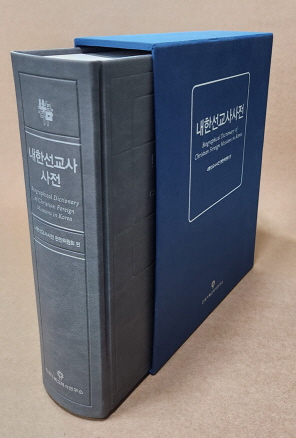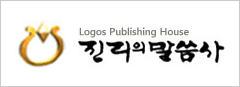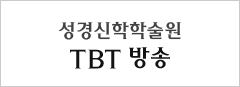오피니언
종교 건축과 기독교 건축 (7)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행전 17:22–23 개역성경)
근대 이후 희극은 희망, 위안, 사회적 긴장, 고단함을
해소해 주는 기능을 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구분하여 인간에게 주신 특징 중 하나는 ‘웃음’이다. 웃음은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는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의학 등 여러 측면에서 인간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웃음과 연관된 치료법 등이 선풍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다. 고대에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서 희극(喜劇)을 공연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스꽝스러운 웃음을 유발케 하는 고대 희극의 역사를 종교 건축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희극의 전통은 고려시대의 광대(廣大)와 조선시대 장터 또는 야외 마당 등에서 비롯되었다. 유교적 질서가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에서 억압된 서민층은 민간 오락과 더불어 해학(諧謔)·풍자(諷刺) 문화에서 발생했다. 주로 희극의 형태는 탈춤, 꼭두각시놀음, 남사당패, 판소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연의 주제는 양반 사회의 비판, 계급 질서, 성적(性的) 위선, 탐관오리, 부패한 승려 등의 풍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의 희극은 억압받는 서민들에게 웃음을 통한 일상의 탈출구이자 사회적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정화(淨化)를 경험하는 장이었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와 함께 베이비부머(Baby Boomers) 세대에서의 희극, ‘Comedy(코메디)’는 TV 프로그램, 극장식 쇼,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관람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은 힘겹고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고 정화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코메디 문화’의 해학과 풍자는 현재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과 위안을 주는 데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회적 긴장과 고단함을 해소해 주는 기능을 했다.
드라마의 한 장르 희극은 최초로 고대 그리스에서 경연이 열렸다
한편 고대 그리스인들의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이용한 종교 건축물인 극장에서는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을 숭배하는 제의(祭儀)의 일환으로 비극·희극이 공연되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희극은 귀족적인 문화의 산물인 비극과 달리 서민적이면서도 토속적인 비속어와 성적(性的) 일탈성(逸脫性)을 지닌 대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대 그리스 희극이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일탈성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
고대 그리스 희극은 국가적·공적 행사로 제도권 안에서 종교적 제전(祭典)과 예술적 가치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첨가되어 있었다. 기원전 534년 그리스 신화 속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종교적인 건축물인 그리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극장(Theatre of Dionysus)에서 참주(潛主)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가 디오니소스 제전(祭典)을 열었을 때는 앞서 다루었던 비극 공연으로만 경연이 열렸다. 그로부터 48년이 지난 기원전 486년에는 비극(Tragedy)과 함께 대표적인 드라마의 한 장르인 희극(喜劇) 경연이 열렸다.
희극은 디오니소스 제전 축제 행렬의 노래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희극 Comedy(코메디)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κωμῳδiα(komoidia: 코모이디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단어는 합성어로 ‘κῶμοc(komos: 코모스)’ 포도 재배를 관장하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축제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노래하며 퍼레이드를 벌이던 행렬과 ‘ᾠδn(odḗ, 오데)’ 노래라는 뜻이 합쳐진 ‘κωμῳδ&iα(komoidia, 코모이디아)’이다. 다시 말하면 ‘축제 행렬의 노래’를 말한다. 또 다른 설(說)로는 일부 고대 문헌이나 그 당시 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BC 322)의 저서 『시학』 해석자 중 일부가 희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κwμη(kṓme, 코메)’는 아테네 성 밖 변두리 작은 공동체 마을이라는 뜻이고, 노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ἀοιδ&iα(aoidia, 아오이디아)’와의 합성어로서 아테네 성안 주류세력으로부터 소외된 비주류들이 주류사회를 향해 불만, 비판, 조롱, 욕설 등을 표출한 ‘성 밖 변두리를 떠도는 공동체 사람들의 노래’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희극은 왕족, 영웅, 귀족 등의 소재를 삼은 비극과 달리 주인공은 국가 정책에서 소외된 비주류층인 농부, 여인, 노예, 천민 등이 주로 등장하면서 서민들의 힘겨운 삶의 일상을 배경으로 기득권자들을 향해 조롱과 풍자적 비판을 소재로 담아 공연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농부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전(祭典)에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불렀던 합창에서 비롯된 비극(트라고디아: Tragoidia)과는 대조를 이룬다. 희극은 이 축제 행렬, 즉 ‘κῶμοc(komos: 코모스)’에서 일시 정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극적인 요소가 덧붙여지면서 발전한 것이 ‘κωμῳδiα(kom&oidia: 코모이디아: 희극)’이다. 이러한 코모이디아 희극은 비극처럼 처음에는 연극이 아니었다. 코모스 가장행렬에서 디오니소스 신이 주신 포도주에 취한 남자들이 춤과 노래와 더불어 연극적인 요소인 짧은 이야기들이 연출되면서 연극의 형태를 갖추어 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시학』에서 희극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전, 코모스 행렬에서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떠들고 흥이 나게 놀아야만 겨우내 추위에 얼어버린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농사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땅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대지의 여신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추운 겨울에 얼어붙어 잠들어 있는 대지의 여신을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깨우는 방법이 필요했다. 고대 그리스 남성들은 여신을 깨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외설(猥褻)적인 행동으로 성적인 자극을 주면 대지의 여신이 긴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래서 이들은 여신을 깨우기 위해 남근(男根)과 엉덩이를 과대 분장한 모습으로 행렬에 등장하여 발로 땅을 힘차게 두드리는 행동을 하면서 남근 찬가를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행렬에서 시작한 미완성의 희극이 장소를 고정된 극장으로 옮겨 공연하면서 제자리를 찾았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경연대회가 열렸던 비극은 3일 동안 4편의 극이 공연되었지만, 희극은 1일 동안 5편으로 경연을 펼쳤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희극은 비극보다 시민들에게 대중성이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기원전 440년경부터는 희극이 극장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 중에도 희극이 공연되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희극을 통해 전쟁의 아픔에 대한 치유와 위로, 즉 내일의 희망을 주기 위한 카타르시스 정화의 차원과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 경연대회를 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희극작가 중에는 극을 통해 시민들에게 반전(反戰)을 외치는 평화주의자도 있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강론하려고 아테네 성에 머물고 있을 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함을 표현한 적이 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분함을 느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아테네 시민들은 삶 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동일시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건축물은 인간이 만든 우상과 함께 종교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중점을 두고 건설하였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은 이러한 종교 건축물과 함께 그들의 삶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고찰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성경의 부분적인 구절을 인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이오현 편집국장 ((주)한국크리스천신문, 장안중앙교회 장로) 이메일 : |
 전가와 주입의 차이로 본 칭의와 성화 이해하기 전가와 주입의 차이로 본 칭의와 성화 이해하기 |
 12문 12돌에 새겨질 이름들 12문 12돌에 새겨질 이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