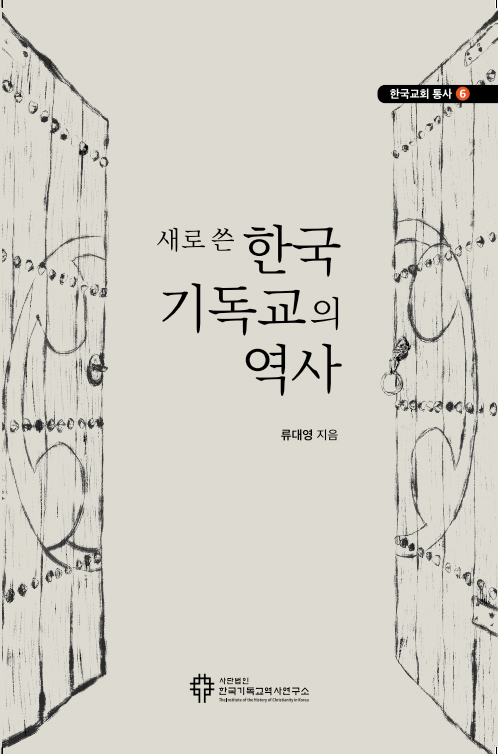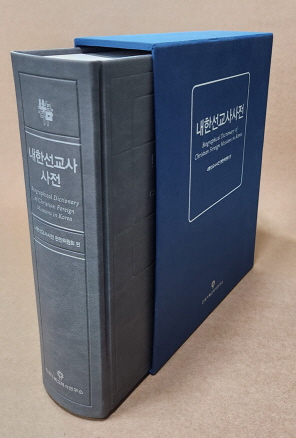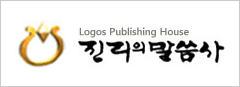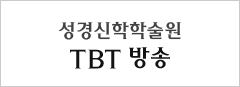мЛ†нХЩ
20мДЄкЄ∞мЭШ к±∞мВ∞ мєЉ л∞Фл•інКЄмЭШ вАШ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мЛ†мХЩлђЄлЛµ нХімД§вАЩ
мєЉ л∞Фл•інКЄ(Karl Barth, 1886-1968), кЈЄл•Љ 20мДЄкЄ∞ мµЬк≥†мЭШ мЛ†нХЩмЮРлЭЉк≥† нХШл©і лИДк∞А лєДнМРнХ†кєМ? кєАмІДнШБмЭА нМРлД®л≤†л•інБђ(Wolfhard Pannenberg, 1928~2014)мЭШ <м°∞мІБмЛ†нХЩ мДЬл°†>(лєДмХД)мЭД мДЬнПЙнХШл©імДЬ, 2006лЕД 20мДЄкЄ∞ мШБн֕놕 мЮИлКФ 32мЭЄмЭШ мЛ†нХЩмЮРл•Љ мґФм≤ЬнХімДЬ, мЫФлУЬмїµ л∞©мЛЭмЬЉл°Ь к≤∞мКє мІДмґЬмЭД кЈЄл†ЄлЛ§. 8к∞ХмЧРмДЬ нМРлД®л≤†л•інБђмЩА нП∞ л∞ЬнГАмЮРл•ік∞А лІМлВђк≥†, нМРлД®л≤†л•інБђк∞А мґ©к≤©м†БмЭЄ нМ®л∞∞л•Љ нЦИлЛ§к≥† мГБмГБнЦИлЛ§. кЈЄлЯ∞лН∞ мЪ∞мКємЮРлКФ нП∞ л∞ЬнГАмЮРл•і(Hans Urs von Balthasar, 1905-1988)л•Љ кЇЊмЭА мЬДл•ік≤Р л™∞нКЄлІМ(Jürgen Moltmann, 1926-2024)мЭімЧИлЛ§. кєАмІДнШБмЭі мЭЄмЪ©нХЬ кЈЄл¶ЉмЭА нМРлД®л≤†л•інБђмЭШ нГБмЫФмД±мЭД к∞Дм†См†БмЭік≥† мЮђлѓЄмЮИк≤М нСЬнШДнХШлКФ кµђлПДлЭЉк≥† мГЭк∞БлРШмЧИлЛ§. л™∞нКЄлІМ, л∞ЬнГАмЮРл•і, нМРлД®л≤†л•інБђ л™®лСР мєЉ л∞Фл•інКЄл•Љ нПЙк∞АнХШк≥† лєДнМРнХШл©∞ мЛ†нХЩм†Б к±∞л™©мЭі лРШмЧИлЛ§. л∞ЬнГАмЮРл•імЭШ л∞Фл•інКЄ нПЙк∞АлКФ нХЬкµ≠мЧРмДЬ лФ∞л•ілКФ мЮРк∞А мЧЖмЭД м†ХлПДл°Ь лПЕнКєнХШлЛ§. кєАмІДнШБмЭА кЈЄлУ§мЭі л∞Фл•інКЄл•Љ лДШмЧИлЛ§к≥† нПЙк∞АнХШлКФлН∞, нХДмЮРлКФ кЈЄл†ЗмІА мХКлЛ§к≥† мГЭк∞БлРЬлЛ§. л∞Фл•інКЄ мШЖмЧР мЮРкЄ∞ мЭіл¶ДмЭД к∞Ам†ЄлЛ§ лМАлКФ к≤ГмЧР мД±к≥µнХЬ нХЩмЮРлУ§мЭілЛ§. кЈЄлЯ∞лН∞ мєЉ л∞Фл•інКЄлКФ 32мЭЄмЭШ к≤МмЮДмЧР м∞Єк∞АнХШмІА л™їнЦИлЛ§лКФ к≤ГмЭі мЮђлѓЄмЮИлКФ л™®мКµмЭілЛ§. л∞Фл•інКЄк∞А мВђмГБмЭШ л∞©лМАнХ®мЭА лИДкµђлПД мЭШмЛђнХШмІА мХКмІАлІМ, кЈЄ к≥Љм†ХмЧР лєДмДЬ мГђл°ѓнЕМ(Charlotte von Kirschbaum, 1899-1975)мЭШ лПДмЫАмЭі мЮИмЧИлЛ§лКФ к≤ГмЧР лМАнХімДЬ мЭШмЛђнХШмІА мХКлКФлЛ§. мГђл°ѓнЕМлКФ 1929лЕДлґАнД∞ лєДмДЬл°ЬмДЬ л∞Фл•інКЄмЭШ мІСмЧРмДЬ 1968лЕД л∞Фл•інКЄк∞А м£љмЭД лХМкєМмІА 39лЕД лПЩмХИ нХ®кїШ нЦИлЛ§. вАЬкЈЄлЕАлКФ лВШмЩА лІИм∞ђк∞АмІАл°Ь мЭі мЮСмЧЕмЭШ мД±мЮ•мЧР мЮРмЛ†мЭШ мВґк≥Љ нЮШмЭД л∞Фм≥§лЛ§. кЈЄлЕАмЭШ нШС놕мЭі мЧЖмЧИлЛ§л©і мЭі мЮСмЧЕмЭА нХШл£®лПД мІДм†ДлРШмІА л™їнЦИмЭД к≤ГмЭілЛ§.вАЭлЭЉк≥† л∞Фл•інКЄк∞А гАОкµРнЪМкµРмЭШнХЩгАП III/3 мДЬлђЄмЧРмДЬ л∞ЭнЮИкЄ∞лПД нЦИлЛ§. л∞Фл•інКЄлКФ 1927лЕД гАОкЄ∞лПЕкµР кµРмЭШнХЩгАПмЭД л∞Ьк∞ДнЦИлКФлН∞, 1932лЕД гАОкµРнЪМкµРмЭШнХЩгАП(Kirchliche Dogmatik) I/1мЭД мґЬк∞ДнХШл©∞, гАОкµРнЪМкµРмЭШнХЩгАП мЛ†нХЩмЮРк∞А лРШмЧИлЛ§. гАОкµРнЪМкµРмЭШнХЩгАП IV/4кґМмЭі 1967лЕД лѓЄмЩДмД±мЬЉл°Ь мґЬнМРлРШк≥†, 1968лЕДмЧР мВђлІЭнЦИлЛ§. л∞Фл•інКЄмЭШ гАОкµРнЪМкµРмЭШнХЩгАПлњРлІМ мХДлЛИлЭЉ 1929лЕД лТ§лґАнД∞лКФ нХ≠мГБ мГђл°ѓнЕМк∞А нХ®кїШ нЦИлЛ§. кЈЄлЕАмЭШ мШБн֕놕мЭА мЭЄм†ХнХШмІАлІМ л≤ФмЬДкєМмІА нММмХЕнХ† мИШ мЧЖлЛ§. кЈЄлЮШмДЬ 20мДЄкЄ∞ мµЬк≥† мЛ†нХЩмЮРмЭШ к≤МмЮДмЧРмДЬ л∞Фл•інКЄк∞А м∞Єк∞АнХШмІА л™їнЦИк≥†, мШ§нЮИ놧 л∞Фл•інКЄл•Љ мЧ∞кµђнХШлКФ нХЩмЮРлУ§мЭі к≤љмЯБнХімДЬ л∞Фл•інКЄл•Љ мЮШ мЧ∞кµђнХЬ л™∞нКЄлІМмЭі мЪ∞мКємЮРк∞А лРШмЧИлЛ§.
л∞Фл•інКЄлКФ мЭЄмГЭ лІИмІАлІЙ 됳놵мЧР гАОнХШлВШлЛШмЭШ мЭЄк∞ДмД±гАП(Die Menschlichkeit Gottes, 1956лЕД: 2017лЕД мЛ†м§АнШЄк∞А мГИлђЉк≤∞нФМлЯђмК§мЧРмДЬ л≤ИмЧ≠нХімДЬ мґЬнМРнХ®)мЭД мІСнХДнЦИлЛ§. л∞Фл•інКЄмЭШ лЛ®нОЄ м§СмЧР <Die christliche Lehre nach dem Heidelberger Katechismus>(1947лЕД)к∞А мЮИлЛ§. кєАмВ∞лНХ л≤ИмЧ≠мЬЉл°Ь мГИлђЉк≤∞нФМлЯђмК§мЧРмДЬ <мєЉ л∞Фл•інКЄмЭШ 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Л†мХЩлђЄлЛµнХімД§>мЭілЭЉлКФ м†Ьл™©мЬЉл°Ь мґЬнМРлРШмЧИлЛ§.
л∞Фл•інКЄк∞А мЭінХінХЬ 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ЪФл¶ђлђЄлЛµмЭА лђімЧЗмЭЉкєМ? *кєАмВ∞лНХмЭА вАШмЪФл¶ђлђЄлЛµ(Catechism)вАЩмЭД вАШмЛ†мХЩлђЄлЛµвАЩмЬЉл°Ь л≤ИмЧ≠нЦИлКФлН∞, мЭЉл≥ЄмЛЭ мЦінЬШ(дњ°дї∞еХПз≠Ф)л°Ь л≤ИмЧ≠нХЬ к≤ГмЬЉл°Ь л≥імЭЄлЛ§. мЭЉл≥ЄмЧРмДЬ <мєЉ л∞Фл•інКЄмЭШ 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Л†мХЩлђЄлЛµнХімД§>мЭА 1954лЕДмЧР л≤ИмЧ≠лРШмЧИлЛ§к≥† нХШлКФлН∞, мЭЉл≥ЄмЭА лПЕмЭЉ мЮСнТИмЧР лМАнХімДЬлКФ мХДм£Љ мЛ†мЖНнХШк≤М л≤ИмЧ≠нХШлКФ к≤Г к∞ЩлЛ§. л∞Фл•інКЄмЭШ гАОкµРнЪМкµРмЭШнХЩгАПлПД мЪ∞л¶ђлКФ мµЬкЈЉмЧР л≤ИмЧ≠лРШмЧИлКФлН∞, мЭЉл≥ЄмЭА мШ§лЮШм†ДмЧР м†ДмІСмЭі л≤ИмЧ≠лРШмЧИлЛ§.
нХЬкµ≠, мЭЉл≥Є, м§Скµ≠мЭШ мЛ†нХЩк≥Д мЦінЬШлКФ мХљк∞ДмЭШ м∞®мЭік∞А мЮИлЛ§. лПЩмЭЉнХЬ нХЬмЮРмЦіл•Љ мВђмЪ©нХШкЄ∞ лХМлђЄмЧР мЭЉмєШмЛЬнВ®лЛ§л©і мҐЛк≤†лЛ§лКФ мГЭк∞БмЭі мЮИлЛ§. мЪ∞л¶ђ мЛ†нХЩк≥ДлКФ мЭЉл≥ЄмЭШ мШБнЦ•мЭі мГБлЛєнЮИ нБђлЛ§. мЭЉм†ЬмЛЭлѓЉмІА мЛЬлМАл•Љ мІАлВШл©імДЬ мЭЉл≥ЄмЦі л≤ИмЧ≠мЭі мҐА лНФ мЭµмИЩнЦИкЄ∞ лХМлђЄмЭЉ к≤ГмЭілЛ§. кЈЄлЮШмДЬ л≥імИШм†Б мД±нЦ•мЧРмДЬ мєЉ лє®нКЄ(л∞ЬнКЄ, л∞ХнШХл£°, мДЬм≤†мЫР)л•Љ мВђмЪ©нХШлКФлН∞, мЭЉл≥Є л≤ИмЧ≠мЭШ мШБнЦ•мЬЉл°Ь мєЉ л∞Фл•інКЄ(мЭімҐЕмД±: гВЂーгГЂ гГРгГЂгГИ)л•Љ мВђмЪ©нХШк≥† мЮИлЛ§. мЪ∞л¶ђлКФ Baltisches Meerл•Љ вАШл∞ЬнКЄнХівАЩлЭЉк≥† мЭљмЬЉл©імДЬ BarthлКФ вАШл∞Фл•інКЄвАЩлЭЉк≥† мЭљлКФлЛ§. кЈЄлЯђлВШ мЦЄмЦілКФ нХ©л¶ђмД±л≥ілЛ§ мЛЬмЮ•мД±мЭі мЪ∞мД†нХЬлЛ§.
нХЬкµ≠ кµРнЪМлКФ WCC. WEA. л°ЬмЮФмД†кµРлМАнЪМмЧРмДЬ нБ∞ к≤©лПЩмЭД к≤™к≥† мЮИлЛ§. мЭі к±∞лМАнХЬ к≤©лПЩмЧР л≥імЭілКФ нХ®мИШлКФ вАЬлПЩмД±мХ†вАЭмЭілЛ§. л≥імЭілКФ к≤ГмЭД к≥µк≤©нХШлКФ к≤ГмЭА к≤∞мљФ кЇЊмІА л™їнХ† к≤ГмЭілЛ§. нХДмЮРлКФ мЭі к±∞лМАнХЬ к≤©лПЩмЧР л≥імЭімІА мХКлКФ нХ®мИШк∞А мєЉ л∞Фл•інКЄлЭЉк≥† м†ЬмЦЄнХЬлЛ§. мД±к≤љмЭД мЧ∞кµђнХШкЄ∞ мЬДнХімДЬ мЛ†нХЩмЭД нЦИлЛ§к∞А, мєЉ л∞Фл•інКЄл•Љ лєДнПЙнХШлКФ к≤ГмЬЉл°Ь л∞ХмВђнХЩмЬДл•Љ мЈ®лУЭнЦИк≥†, мІАкЄИкєМмІА л™З м§ДмФ© л∞Фл•інКЄмЭШ кЄАмЭД мЭљк≥† мЮИлЛ§. кЈЄлЮШмДЬ л∞Фл•інКЄмЧР кіАнХЬ м†АмИ†мЭА кЊЄм§АнЮИ кµђмЮЕнХШк≥† мЮИлЛ§. мЭіл≤ИмЧР л∞Фл•інКЄк∞А 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ЪФл¶ђлђЄлЛµмЭД нХімД§нЦИлЛ§лКФ м†Хл≥іл•Љ мЮШ мХМмІА л™їнЦИлКФлН∞, м±Е мЖМк∞Ьл•Љ лУ£к≥† л∞Фл°Ь кµђмЮЕнЦИлЛ§. м£ЉлІИк∞ДмВ∞(иµ∞й¶ђзЬЛе±±)мЬЉл°Ь мВінХА лТ§мЧР к∞ДлЮµнХШк≤М мДЬнПЙмЭД мШђл¶ђл©∞ к≥µмЬ†нХШк≥† мЮИлЛ§.
мєЉ л∞Фл•інКЄмЭШ м†АмИ†мЭі л≤ИмЧ≠лРШлКФ к≤ГмЭА мҐЛлЛ§. л∞Фл•інКЄмЭШ мВђмГБмЭД мҐА лНФ лє†л•ік≤М мЭЄмІАнХ† мИШ мЮИкЄ∞ лХМлђЄмЭілЛ§. кЈЄлЯђлВШ л∞Фл•інКЄмЧР лМАнХЬ кЄНм†Хм†Б мВђмГБмЭі лНФ лє†л•ік≤М нЩХмВ∞лР† к≤ГмЭілЛ§. кЈЄлЯђлВШ мє®лђµмЛЬнВ§л©∞ мЮ†мЮђмЛЬнВђ мИШ мЧЖлЛ§. м†БкЈєм†БмЬЉл°Ь к∞Ьл∞©нХШл©∞ м†БкЈєм†БмЬЉл°Ь лВШмДЬмХЉ нХЬлЛ§.
л∞Фл•інКЄмЭШ вАЬ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ЪФл¶ђлђЄлЛµвАЭмЭА л∞Фл•інКЄк∞А нХімД§нЦИлЛ§кЄ∞л≥ілЛ§, л∞Фл•інКЄмЭШ лЕЉм†Ьл•Љ 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ЪФл¶ђлђЄлЛµмЧР мЬµнХ©мЛЬнВ® к≤ГмЬЉл°Ь л≥імЭЄлЛ§. 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ЪФл¶ђлђЄлЛµ(1563лЕД)мЭА 129лђЄмЬЉл°Ь лРШмЦі мЮИк≥†, 52м£Љк∞Д мД§кµРнХ† мИШ мЮИлПДл°Э кЈЬм†ХлРШмЦі мЮИлЛ§. кЈЄлЯ∞лН∞ л∞Фл•інКЄлКФ 28мЮ•мЬЉл°Ь лВШлИДмЧИк≥†, 1-2мЮ•мЭА к∞Ьл°†м†Б мД§л™ЕмЭік≥†, 3мЮ•лґАнД∞ 28мЮ•кєМмІА мЪФл¶ђлђЄлЛµ нХімД§мЭД кµђмД±нЦИлЛ§. кЈЄлЯ∞лН∞ 19мЮ•лґАнД∞ 28мЮ•кєМмІАлКФ нХімД§мЭі лРШмІА мХКмЭА лѓЄмЩДмД± мЮСнТИмЭілЛ§. вАЬ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ЪФл¶ђлђЄлЛµвАЭмЭА к∞ХмЭШл°ЭмЬЉл°Ь л≥імЭілКФлН∞, 18мЮ•кєМмІА к∞ХмЭШнХЬ к≤ГмЬЉл°Ь л≥імЭЄлЛ§. кЈЄлЯ∞лН∞ л∞Фл•інКЄлКФ гАОкµРнЪМкµРмЭШнХЩгАПм≤ШлЯЉ мЛЬмЮСнХШкЄ∞ м†ДмЧР нХµмЛђлђЄмЮ•мЭД лВ®кЄі лТ§мЧР мД§л™ЕмЭД мІДнЦЙнХЬлЛ§. кЈЄ нХµмЛђлђЄмЮ•мЭА л∞Фл•інКЄмЭШ мВђмГБмЬЉл°Ь л≥імЭік≥†, кЈЄк≤ГмЧР 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ЪФл¶ђлђЄлЛµмЭД лІЮмЈДлЛ§к≥† нПЙк∞АнХШк≥† мЛґлЛ§.
л≤ИмЧ≠мЭА к≤∞мљФ мЙђмЪі мЭЉмЭі мХДлЛИлЛ§. л∞Фл•інКЄмЭШ мВђмГБмЭД м†ХнЩХнХШк≤М м†ДлЛђнХШкЄ∞ мЬДнХімДЬлКФ нХµмЛђ мЪ©мЦілКФ лПЕмЭЉмЦіл°Ь нСЬкЄ∞нХі м£ЉмЦімХЉ нХЬлЛ§. мЭі м†АмИ†мЧРмДЬ мГБлЛєнЮИ лІОмЭі л∞Шл≥µлРШлКФ лЛ®мЦімЧР вАШм†ХмГБмД±вАЩмЭі мЮИлКФлН∞, лПЕмЭЉмЦіл•Љ м∞ЊмІА л™їнХі мЦілЦ§ мЭШлѓЄмЭЄмІА мХМкЄ∞ мֳ놵лЛ§. л®Љм†А мШБмЦі л≤ИмЧ≠мЭД кµђмЮЕнЦИлКФлН∞, right of GodмЬЉл°Ь л≥імЭЄлЛ§. кЈЄл¶ђк≥† вАШкµРл¶ђвАЩлКФ лІ§мЪ∞ м§СмЪФнХЬ лЛ®мЦімЭЄлН∞, лПЕмЭЉмЦік∞А мЧЖкЄ∞ лХМлђЄмЧР нМРлЛ®мЭі мЙљмІА мХКлЛ§. л≥ЄлђЄмЧРмДЬ л≥іл©і вАШLehreвАЩл•Љ кµРл¶ђл°Ь мЭінХінХ† мИШ мЮИлПДл°Э лРШмЦі мЮИлКФлН∞, мҐЛмЭА л≤ИмЧ≠мЭі мХДлЛИлЛ§. вАШdoctrineвАЩлПД вАШкµРл¶ђвАЩлЭЉк≥† нХШмІАлІМ, вАШDogmaвАЩлПД вАШкµРл¶ђвАЩл°Ь л≤ИмЧ≠нХЬлЛ§. л≥µмЭМмЭА вАЬкЄ∞мБЬ мВђмЛ†(Botschaft)вАЭмЬЉл°Ь нСЬнШДнЦИлЛ§. мЭілЯ∞ лЛ®мЦілКФ лПЕмЭЉмЦі нСЬнШДмЭД л∞Шл≥µнХілПД лВШмБШмІА мХКлЛ§. мЭі мГБнГЬл°Ь л∞Фл•інКЄмЭШ мЭШлѓЄк∞А м†ХнЩХнХШк≤М м†ДлЛђлРШмІА мХКлКФлЛ§л©і, к≤∞кµ≠ нХЬ мҐЛмЭА л≤ИмЧ≠мДЬмЧР лґИк≥ЉнХШк≤М лР† мИШ мЮИлЛ§. кЈЄлЮШмДЬ мЭЉлЛ®мЭА мШБмЦі л≤ИмЧ≠мЭД кµђлІ§нЦИлЛ§.
л∞Фл•інКЄмЭШ кЄАмЭілВШ кЈЄмЧР кіАнХЬ кЄАмЭД лІМлВШл©і к±∞мЭШ кµђмЮЕнХЬлЛ§. мЭљлУ†мІА мЭљмІА мХКлУ†мІА кµђмЮЕнХЬлЛ§. кЈЄлЯ∞лН∞ кЈЄк∞А мЪ∞л¶ђк∞А мҐЛмХДнХШлКФ 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ЪФл¶ђлђЄлЛµмЭД нХімД§нЦИлЛ§к≥† нХШлЛИ кЉ≠ мЭљмЦімХЉк≤†к≥†, мЪ∞л¶ђк∞А мЭінХінХШлКФ к≤Гк≥Љ мЦілЦ§ м∞®мЭім†РмЭД к∞Цк≥† мЮИлКФмІА нММмХЕнХШ놧к≥† нХЬлЛ§. кЈЄлЯ∞лН∞ к∞ХмЭШ лВімЪ©мЭімЦімДЬ кЈЄлЯ∞мІА кєКмЭА лВімЪ©л≥ілЛ§ к∞ДлЮµнХЬ мЮРкЄ∞ к∞ЬлЕРмЭі лВШмЧілРШк≥† мЮИлЛ§. л∞Фл•інКЄлКФ 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ЪФл¶ђлђЄлЛµмЭШ м†АмЮРмЭШ лѓњмЭМк≥Љ мЛђмЮ•мЭД л≥іл†§лКФ мЭШлПДлКФ мЧЖлКФ к≤Г к∞ЩлЛ§. мЮРкЄ∞ мЭШлѓЄмЩА мЭШлПДмЧР лІЮмґ∞мДЬ нХШмЭілНЄл≤†л•інБђ мЪФл¶ђлђЄлЛµмЭД нХімД§нХЬ к≤ГмЭілЛ§. кЈЄлЮШлПД л∞Фл•інКЄмЭШ кЄАмЭД л≥ілКФ к≤ГмЭА мЭШлѓЄ мЮИлКФ мЭЉмЭілЛ§.
|
кЄАмУімЭі нФДл°ЬнХД кЄАмУімЭі : к≥†к≤љнГЬ л™©мВђ (м£ЉлЛШмЭШкµРнЪМ / нШХлЮМмДЬмЫР) мЭіл©ФмЭЉ : |
 л∞Фл•інКЄ, мЮРмЬ†м£ЉмЭШ мЧ∞мЖНк≥Љ лґИмЧ∞мЖН (2) л∞Фл•інКЄ, мЮРмЬ†м£ЉмЭШ мЧ∞мЖНк≥Љ лґИмЧ∞мЖН (2) |
 л∞Фл•інКЄ, мЮРмЬ†м£ЉмЭШ мЧ∞мЖНк≥Љ лґИмЧ∞мЖН л∞Фл•інКЄ, мЮРмЬ†м£ЉмЭШ мЧ∞мЖНк≥Љ лґИмЧ∞мЖН |